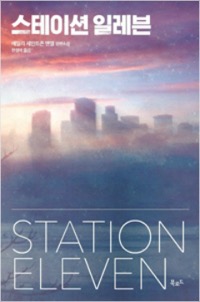짠. 짜-안.
도쿄타워를 봤다. 도쿄타워 아래에 가진 않고 타워를 더욱 잘 볼 수 있는 롯폰기힐즈 전망대에 올라서 보았다. 도쿄 여행은 모니터 너머로만 보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되는 경험이었다고 얘기했던가? 마지막까지 그러했다. 정말로 보고 싶던 도쿄타워를 보고 있으려니 걱정이 사라지는걸 느낄 수 있었다. 이러려고 여행 온 거였구나. 이걸 보기 위해서 왔구나.


전망대에서는 도쿄타워만 볼 수 있던 건 아니었다. 이번 여행엔 가보지 못했던 레인보우 브릿지도 보였고, 저 멀리 이제 도쿄의 제일 높은 곳을 차지한 스카이트리도 대략이나마 보였다. 너무 높지 않은 곳에서 도시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건 꽤 즐거운 일이었다. 서울타워에선 이런 각도로 내려다 볼 수 없으니.
우린 전망대에서 시간을 꽤 보냈다. 타워가 예뻐서도 그랬지만 오늘 너무 걸어서 다리가 아파서 그랬다. 예쁜 풍경보며 앉아있는데도 회복은 더디니 느긋하게 앉아서 얘기나 하고 있다가 시간도 늦어져가고 사실 배도 좀 고프고 해서 일어났다. 뭔가 먹기 전에 롯폰기힐즈의 일루미네이션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예쁘지? 예쁘다고 말해요. 일루미네이션이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데다가 저 멀리 도쿄타워가 딱 보이니, 우리말고도 사람들이 있는 편이었다. 난 빨간색보다 푸른 빛의 색이 더 예쁘고 잘 어울려서 맘에 들었다.
그나저나 전에 한번 봐뒀던 근처의 몬쟈야키집에 가니 이미 영업 종료했다는 게 아닌가. 인터넷엔 라스트오더가 30분은 더 남아있다고 써있던데? 어쨌든 그 주변을 맴돌다 오키나와 요리집 ‘마우시 아자부’에 들어갔다.



食べログ
먹고 나온 이후의 시간은, 이 여행에서 가장 실수했던 시간들이고 가장 고생했던 시간들이었다. 무사히 도쿄역에 와서 짐을 찾고는 — 사람들이 거의 없는 도쿄역에서 열심히 캐리어를 정리하던 우리들이었다 — 미리 계획했던 대로 24시간 오픈한다던 맥도날드에 갔더니. 세상에나. 우리가 여행온 첫날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더라! 세상에나.
이때가 거의 새벽 1시. 다시 생각해도 눈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다. 캐리어를 끌고 구석에 주저앉아 이제 어떡하지 어딜 가야하지하고 우왕좌왕하던 우리는 일단 공항행 버스를 타는 라운지를 찾아갔다. 거기도 24시간 운영은 아니고 3시까지만 한다 해서 일단 그때까지 잠을 자고는 이후는 근처 술집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처음부터 이랬어도 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다. 그땐 워낙 정신이 없던 차였다.

적당히 주문하고 우리는 대충 먹다가 잠들었…. 친구는 잠들었지만 나는 이런 일이 생길수록 머리 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끝내 자지 못했다. 왜 다른 계획들을 세워두지 않았을까, 좀 더 일찍 도쿄역에 돌아왔으면 덜 힘들었을까 등등. 많은 생각들이 머리속에 한가득이었다.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선 이륙과 동시에 잠들어서 착륙하며 깼지만 그땐 그랬다. 그러다 새벽이 되었고 버스를 탈 시간이 되었다.
공항까지 오며 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쪽 구석에서 저울을 발견했다. 정말 열심히 가방을 정리했다. 둘 다 처음에 무게가 너무 나와서 당황했고, 여기를 이렇게 저기를 저렇게 열심히 정리해서 겨우 무게를 맞출 수 있었다. 다만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갓파바시에서 구매한 필러를 기내 수하물로 챙기고 만 것이다. 그 사실을 나중에 보안 검색에서 알게 되는 바람에 버리고 올 수 밖에 없었다. 2016년 베스트 필러였다는데…. 지금 이걸 쓰다가 필러 생각이 나서 아련해지는 눈시울이… 큽.

http://www.obon-de-gohan.com/
食べログ
그리곤 공항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다. — 사실 짐정리가 먼저였는지 식사가 먼저였는지 기억이 안난다. — 히츠마부시풍 장어요리가 올라간 오챠즈케. 바로 조금 전까지 뭔가를 계속 먹었으니 크게 먹지는 않고 가볍게 먹기로 한 건데, 생각보다 가볍지는 않았지만 편하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다. 오챠즈케 중에 제일 비싼 메뉴였는데 굳이 그걸 고른 이유가 있다면, 숙소가 아사쿠사임에도 장어 덮밥을 먹지 못한 것이 약간 마음에 걸려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다. 아사쿠사! 장어! 이러던 사람이 먹질 못했으니 공항에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그 후 포켓몬스토어 나리타공항점에서 동생 선물을 사고, 출국 수속을 밟은 후 면세점에서는 물이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 차마 유혹을 거스르지 못하고 상당한 양의 로이스 초콜릿을 샀다. 끝까지 탈탈 털어 무언가를 사온 좋은 여행이었다. 필러를 버리게 된 것 빼고 말이다.
그렇게 도쿄 여행은 끝이 났다. 짧은 시간동안 모든 걸 보기에 도쿄는 너무 거대한 곳이었고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고 싶은 도시가 되었다. 교토도 그런 곳이지만 거기는 쉬러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곳이라면 도쿄는 더 새로운 걸 보고 싶은 도시로 마음 속에 자리 잡았다. 다시 가고 싶다. ‘처음’ 도쿄가 아니라 두번째 세번째 도쿄를 쓰고 싶다.